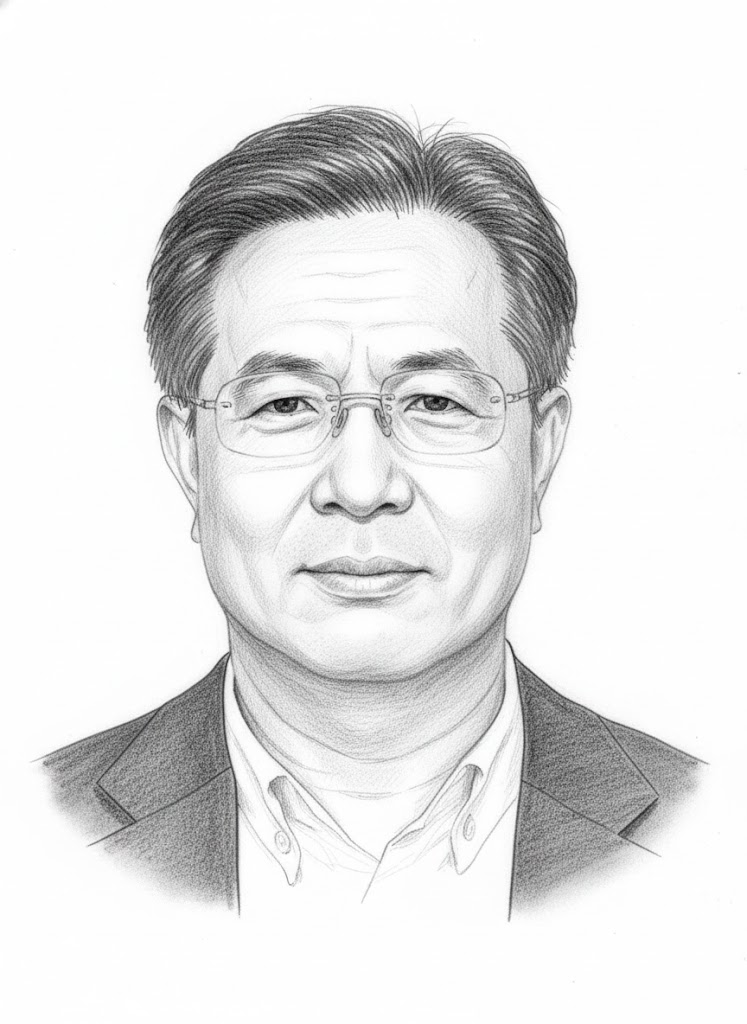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마주하는 정갈한 식탁. 이는 나 자신이 허기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발현이요, 가장 존엄한 약속이며 내일을 향한 고요한 묵상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화려한 이벤트가 신기루처럼 흐릿해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한 끼의 정적 속으로 귀환하는 과정이다. 생의 파고가 높을수록 우리를 지탱하는 건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허기를 달래는 숭고한 닻, 정갈한 식탁이다.
하루라는 풍랑을 견뎌낸 몸과 마음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유일한 성소(聖所)가 정성으로 차려낸 밥상임을 나는 마침내 깨닫는다. 갓 지은 밥 앞에 앉아 수저를 드는 찰나, 마음의 심해(深海)에는 문장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까운 인사가 고인다.
오늘도 무사히 저물었구나. 그 짧은 자성(自省) 한마디에 어깨를 짓누르던 하루의 잔해들이 슬며시 휘발된다. 미각을 마주하는 일은 단순히 혀끝의 유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실존적 구원이자, 나라는 생(生)을 향한 가장 정직한 예우다.
식사는 허기를 지우는 물리적 공정을 넘어선다. 밥물 끓는 구수한 향기가 집안의 공기를 온유하게 데우고, 뚝배기가 보글거리며 낮은 저음의 변주곡을 써 내려갈 때, 가지런히 놓인 찬들은 흐트러진 마음의 결을 비단처럼 매만진다. 식탁 위에서 평범한 일상은 오감의 성대한 제례(祭禮)로 격상된다. 눈에 담기는 색채의 조화, 코끝을 간지럽히는 온기의 향유, 입안에서 전개되는 식감의 서사까지. 모든 감각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힘없던 생기가 되살아난다.
입맛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가장 다정한 안부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욕구는 오늘의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신호이자, 내일을 기어이 살겠다는 본능적인 의지의 발현이다. 음식을 정성껏 마주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는 행위는 자신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존엄한 약속과도 같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따뜻한 밥물을 넘기는 일은, 타인의 시선에 내어주었던 내 삶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나직한 선언이다.
살다 보면 생의 설계도가 어긋나 막막한 날이 있다. 영혼의 허기까지 스며드는 그런 날, 좋아하는 음식을 크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온 감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애쓰던 마음을 바로 봉합한다. 식탁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온기를 내어주는 그곳에서 우리는 부서진 조각들을 추스르고 다시 걸어갈 동력을 얻는다.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 나누는 식사는 서로의 청안(淸安)을 섞어 위로라는 이름의 성찬을 빚어내는 합주다.
음식을 귀히 여긴다는 건 삶을 긍정한다는 증거다. 식사의 경이로움을 아는 생은 이미 그 자체로 울창하다. 유독 시린 겨울날, 김이 서린 냉이국 한 그릇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투박한 뚝배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흙내음과 얼어붙은 지층을 뚫고 올라온 싱그러운 향이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받쳐준다. 그 온기만으로 굳어 있던 하루의 모서리는 둥글게 깎이고, 정지했던 일상은 다시 순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은 나를 향한 가장 지극한 자애심수(自愛心修)이며, 나를 안아주는 가장 다정한 의식이자, 내일의 나를 환대하는 가장 지극한 사랑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